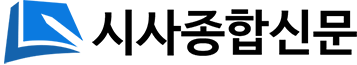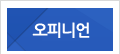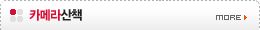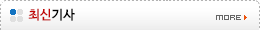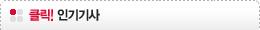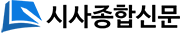농촌소멸의 주된 원인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지방소멸 보고서(마스다 히로야, 2014)에 지방소멸위험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대비 20세~39세 여성인구를 나타낸다. ‘양자 간 비율이 0.5 미만일 경우 인구 재생산 주기를 고려할 때 현재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해당 지역 공동체의 인구기반이 붕괴되고 사회 경제적 기능을 상실한다.’라고 한다.
통계청의 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임신할 수 있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0.7명 이하란 뜻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 고령인구 비율은 25.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도시 이주는 농촌 지역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촌 지역의 경제 활동을 감소시킨다, 의료, 복지, 교육, 문화시설 등 각종 서비스 및 인프라는 축소되고, 일자리 감소로 결국 지역경제의 붕괴 및 ‘지방소멸 악순환’이다.
이를 위해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 및 지역 경제는 농업 활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농업은 물론이고 농업 연관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귀농·귀촌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의 관점에서 후계농 또는 청년농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 이외에 각종 농자재와 농기술, 식품가공 등 농업 연관산업, 교육, 문화생활 영위 등 사회서비스 제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활동이 다각화되어야 농촌사회에 활력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의료, 복지, 주거 등 인프라 개선 및 공공서비스 확대가 절실하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고대한다.


 2026.02.02 (월) 20:37
2026.02.02 (월) 20:37